- 입력 2025.01.31 10:42


 0
0[ 아시아경제 ] 인간의 뇌는 원래 내가 가진 가치관과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설계됐다. 인지부조화의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의 뇌를 분석하면 고통 등 부정적인 정서에 관여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진화과정에서 인간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습득했다. 내 생각과 맞는 정보만 골라 ‘그래도 내가 맞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불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그 뒤로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한다. 이것이 확증편향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를 거치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여기까지 오면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확증편향은 위험하다.

유튜브는 이 확증편향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이다.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 성장한 회사다. 나의 관심사를 토대로 연관 영상을 추천하고, 설령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영상이 추천되면 '관심 없음'이나 '채널 추천 안 함' 버튼을 통해 다시는 추천 목록에 뜨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내 생각과 완벽히 일치하는, 다른 생각과 마주해 불편할 일이 없는 세계관을 구축해준다.
확증편향을 깨기 위해선 다시 나와 다른 가치관에 노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월간 사용자 38억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플랫폼 유튜브도 분명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며 여태 한 번도 작동 방식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렇다 보니 유튜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자정작용이나 외부 제재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입장을 실으면 금방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라는 악플로 도배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성역에 숨은 결국 유튜브는 서부지법 난동과 취재진 린치 등 폭력 사태에 일조한 모양새가 됐다.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유튜버들이 사실 확인 없이 떠드는 영상을 방조했고,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은 대폭 강화됐다. 심지어 영상 조회수로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는 수수료 형식으로 유튜브가 가져갔으니, 범죄 수익까지 나눈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튜브는 묵묵부답이다. 유튜브 코리아는 '정치 알고리즘은 왜 중립적으로 생성되지 않느냐' 등을 묻는 아시아경제 취재에도 '전화 통화로는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고 하다 결국 답변을 약속한 당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플랫폼 제재도 싫고 알고리즘 공개도 싫다면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깰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놔야 하지 않을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책임을 방기하기엔 플랫폼 하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추천
- #기자수첩
- #표현
- #성역
- #유튜브
- #책임
- #자유
- #확증편향
- #경제
- #플랫폼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0
- 1
- 중·고교 다문화학생 대상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 아시아경제
 0
0
- 2
- 전신 쇠약 ‘희귀 근육병’…눈 깜빡여 쓴 논문 기적의 석사학위
- 서울신문
 0
0

- 3
- 韓 재단에 25억원어치 주식 기부…'파친코'로 재산 모은 재일교포 사업가
- 아시아경제
 0
0

- 4
- “육아 공무원에 휴가·가산점 더 준다”…용산구, '육아 친화 4종 세트' 신설
- 아시아경제
 0
0

- 5
- 제주 근현대사 이야기 '제주항' 펴낸 오경훈 소설가 별세
- 아시아경제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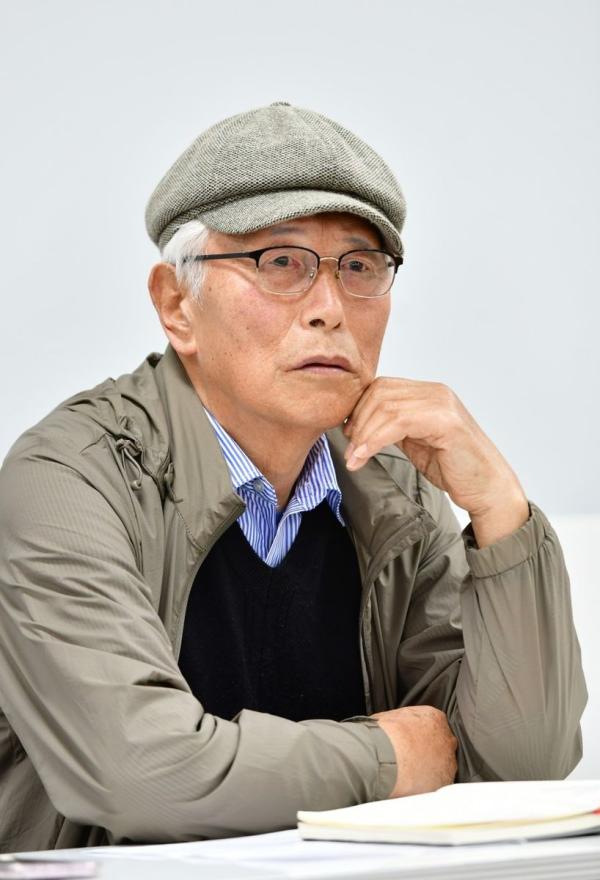
- 6
- 광주시교육청 ‘노벨 문학의 길을 가다’ 운영
- 서울신문
 0
0

- 7
- 경기도, 해빙기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곳 안전점검
- 아시아경제
 0
0

- 8
- 하늘양 유족에 6억원대 배상금 지급…가해 교사에 구상권 청구
- 아시아경제
 0
0

- 9
- 광주 40년 넘은 노후학교 ‘미래형 학교’로 변신
- 서울신문
 0
0

- 10
- 수원시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도움 필요한 시설에 전달해 달라”수원시에1000만 원 기부
- 뉴스패치
 0
0

- 최신뉴스
- 인기뉴스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


 5
5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